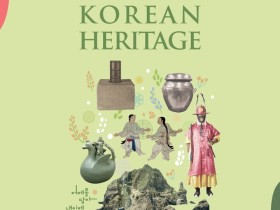기사상세페이지
취월당 밝은 창가에서 이종선
시와 노래는 원래 하나이다. 노래가 시이고 시가 노래이다. 우리 시에는 낭만과 사랑이 들어있고, 정한과 흥이 녹아 배어 있다.
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매주 일 년이 넘도록 노래로 불리던 시를 붓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왔다. 우리의 시를 붓으로 노래한 것이다.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사설’을 연재하면서 나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붓이 시의 흥취와 운율의 고저장단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흐름은 미세하여 다른 이는 알 수 없을 것이나 나는 내내 이 느낌으로 글씨를 썼다.
평시조는 사설시조를 제외하고는 대개 45자 내외로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다. 제한된 글자를 한 서체로 연작連作한다는 것은 작가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같은 체제의 중복으로 자칫 지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마다 변화를 주는 일이 절실했고, 나는 매번 고심하였다. 고체, 궁체, 민체의 모든 한글서체를 총동원했고, 필 속의 완급緩急, 먹의 농담濃淡과 획의 윤삽潤澁을 활용하여 시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정, 장방형의 구도와 선면 형태 등 다양한 지면에 주제를 돋보이는 장법章法을 구사하였다. 종이도 장지, 한지 중국선지 문양지 등을 고루 써서 변화를 주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한글 서체 조형의 변화에 천착해 왔다. 한 글자가 지니고 있는 수평과 수직구조의 조형을 벗어나고, 정형화된 일정한 자간과 행간의 관계를 자유롭게 운용하는 것이다. 수평과 수직구조를 벗어난 불균형의 자형에서 생성되는 활동성을 이용하여 생동감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부정형적不定形的인 낱글자에 대소의 변화를 주어 글자와 글자를 조응하게 하고, 이때 발생하는 불균형을 다음 글자들의 조응을 통해 안정을 이루어 가면서 행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행의 운용에 있어서도 낱글자의 운용에서처럼 첫 행의 불안한 구조를 다음 행이 보완하면서 안정을 이끌고 행과 행이 조응하여 전체 화면의 균형과 조화를 이끌어 내는 것, 이것이 내 작업의 핵심인 것이다.
크고 작은 돌들을 이리저리 쌓아 이룬 석축이나 돌담에서 느끼는 자연미와 조화미를 내 작품에 표현하고자 했다. 이는 마치 개성이 다른 다양한 인간들이 소통하고 융화하면서 건강한 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 과정과 같은 것이고, 서로 다른 식물들이 모여 산야를 이루고 각기 다른 물체들이 온천지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과 맞닿은 것이며, 이것이 바로 천연 속에서 순리를 따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삼라만상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
필자의 이 작업은 주로 고체작품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개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서체이기 때문이다. 이 시도는 민체에서도 이어져 얼핏 같아 보이지만 작품마다 글자마다 모습과 표정을 달리하였다.
필자는 문자를 대함에 한자를 중국 글이라 보지 않는다. 오랜 세월 우리 문화에 젖어들어 체화되었고, 한자를 이용하지 않고는 의미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미 한자는 우리의 문자생활에서 따로 할 수 없어, 한문까지야 능통할 바 없다 하더라도 한자 자체를 모르는 체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한글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상형문자인 한자를 아울러 쓸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문자의 소리와 표정을 두루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한자를 끌어들이지는 않지만 독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품에 기꺼이 이용한다. 이 연재 작품에 한자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런 연유이다. 노래가 만들어질 당시 친숙하게 사용됐던 문투이기에 현대인들에게는 낯설지만 피할 까닭이 없다는 생각에 그대로 썼다. 특히 시인의 시상을 옮기려 하였고 창자의 흥을 얹으려 하였다. 글자와 행간에 운율을 실었고 붓 끝에 흥을 실어 붓으로 노래를 불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아 내 마음 속에서만 울리었고, 춤사위는 손가락 끝을 통해 보이지 않는 대로 붓 터럭의 가닥을 흔들었다.
작품을 쓰는 내내 태백이 되어 달빛 아래 술잔을 기울였고, 가끔은 도연명을 만나려 오류촌을 찾기도 했다. 황진이를 그리워하다가 이름 모를 시인을 만나 코가 삐뚤어지기도 여러 번. 세상에 좋다는 산촌 경개를 거침없이 두루 하였으며, 때론 속절없는 외로움에 가슴을 에다가, 있지도 않는 부귀공명을 버리고 끝내 운림 처사가 되었다. 고래 영웅들이 나누어 누린 복락을 나는 붓으로 노래를 부르며 독차지하였던 것이다. 이 아니 어찌 천복이 아니겠는가.
이번의 전시회는 국악신문에 2020년 9월부터 매주 연재하였던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 음악사설’ 작품 중 52점이 출품되어 백악미술관에서 12월 9일부터 1주일간 진행하였다.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한글서예의 모든 것을 선보이는 기회였다.
붓으로 불린 우리 음악사설이 국악을 사랑하는 이들은 물론 서예인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끈 것은 성과라 하겠다. 귀한 지면을 허락해 주신 ㈜국악신문사에 큰 고마움을 전한다.(2021. 12. 17.)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원장현과 이태백 긴산조 협주곡, “보셨습니까?”
- 2앙상블 시나위가 그려내는 ‘고요의 바다’
- 3대한민국, “문화정책 없는가?”
- 4도자의 여로 (144) <br>분청사기마상배편
- 5제8회 한국예술무형유산 전국경연대회(06/22)
- 6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원 춘향제 개막식’
- 72024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설문대할망을 품은 해녀아리랑' 등
- 8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여주향교 달빛풍류음악회’
- 9문체부·관광공사, 중동 현지에서 K-관광 홍보 강화
- 10의령홍의장군축제 12만명 발길…성공 키워드는 '홍 'RED'
- 11한국구비문학회 24 춘계학술대회
- 12한국전통문화연구회, '고향의 봄' 국악한마당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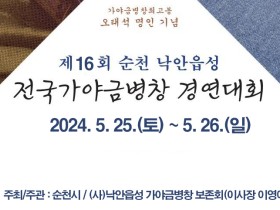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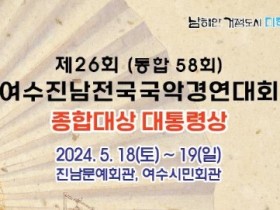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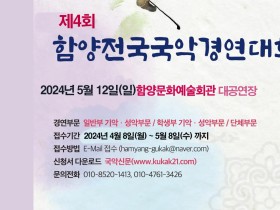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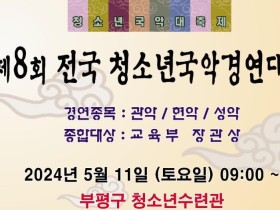



























































![[사설] 후반기 지역축제, 대면 개최 가능성 높다 [사설] 후반기 지역축제, 대면 개최 가능성 높다](https://kukak21.com/data/file/news/thumb-3534942082_xLDkmVCO_6c0ab4c0f9bda5791258891bcfab9234ab950fbd_280x2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