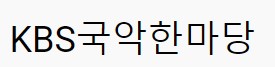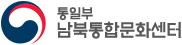2024.05.09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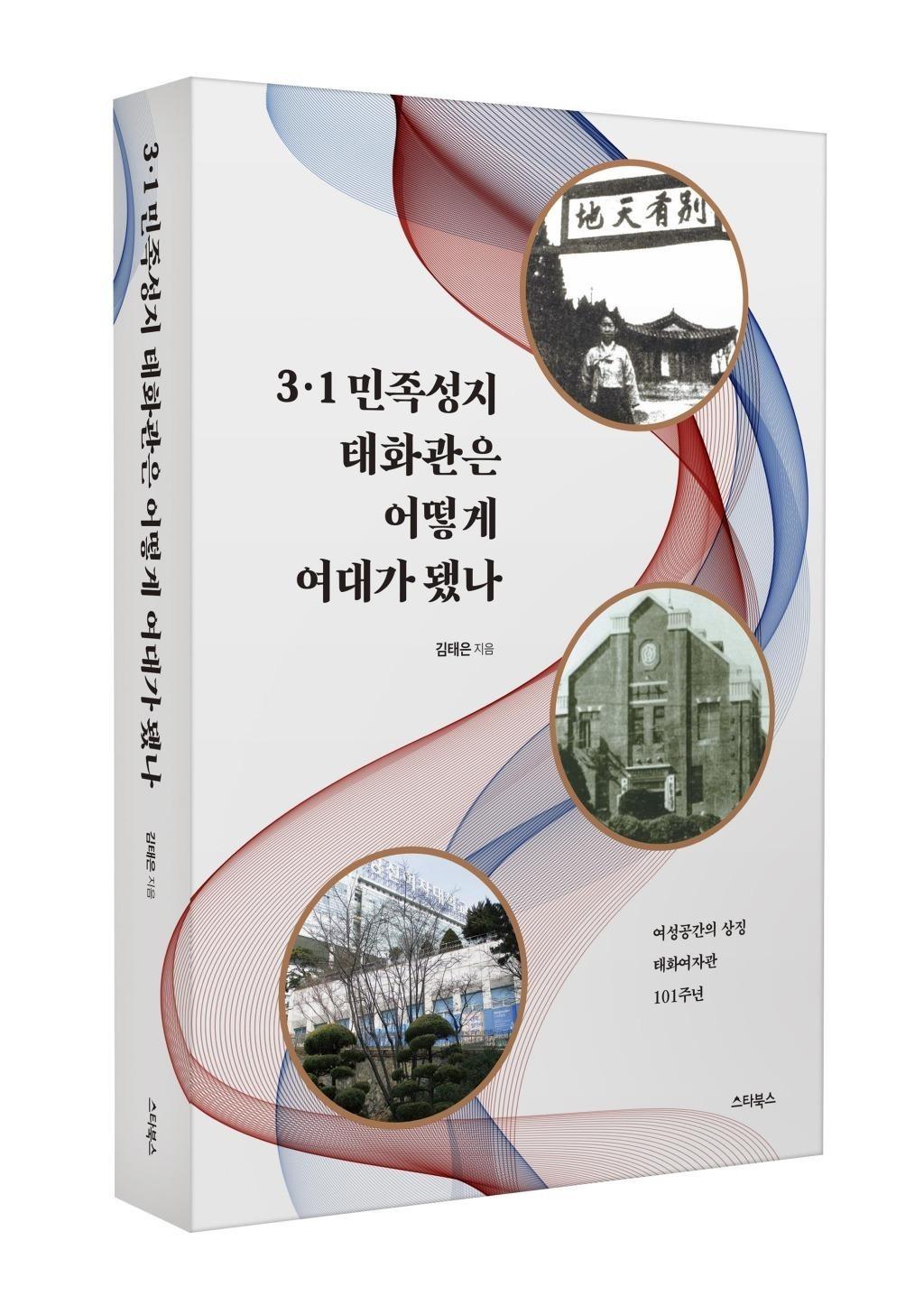
이 책은 2019년 2월, 3·1운동100주년을 맞아 성신언론인회 등의 지원을 받아 독립출판(비매품)했던 ‘3·1정신과 여성교육 100년’의 후속 격이다. 전작은 성신여대(성신학원)가 3·1운동의 발원지인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서 1921년 설립된 태화여학교를 승계한 역사적 사실을 재발굴하면서, 3·1운동이 한국여성에게 끼친 엄청난 영향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 고루한 국사책 속 태화관이 아닌 현재에도 유효한 공간적 의미와 장소성을 되새기는 동시에, 국내에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대학사(大學史)’ 연구의 한 형태로 알음알음 찬사를 받기도 했다.
민족대표들에 의해 기미독립선언식이 이뤄진 태화관이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한, 여성의 공간’으로 변모한 것은 거족적 항일운동이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인구 절반의 삶에 끼친 지배적 영향력을 강렬하게 상징한다. 오히려 한 세기가 흐른 3·1운동 100주년 기념 물결에 여성의 자리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2019년 광복절 옛 태화관 자리에 조성된 ‘3·1독립선언광장’ 준공식에는 역시나 나이든 남자들만 즐비하니 치적을 자랑했다. 그해 말 종교인연합이 추진한 3·1운동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은 ‘할아버지’들의 대잔치로 그쳤다. 한국여성운동의 초석이 다져진 공간조차 다시금 남성들의 전유지가 되는 것은 금방이다.
그 동안 내가 사로잡힌 어구는 ‘역사는 발굴이며 해석이고 경합이 된다’는 어느 역자의 말이었다. 한 번 잊힌 역사가 복원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한 줌이라도 권력을 쥔 자들의 편의나 이해 관계에 따라 엄연한 사실도 어떻게 취사선택되는지를 여실히 보았다. 무엇보다 여성의 역사가 얼마나 홀대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였다. 유사역사학은 배제해야함이 분명하나 근거와 증거가 뚜렷함에도 이른바 ‘정통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한국사가 특정 학교 출신의 초엘리트를 자부하는 몇몇 ‘남성’ 교수들, 혹은 정치적 이용가치에 따라 권력에 빌붙은 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목격했다.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학문적 사기’에 준할 만한 분식(粉飾)도 뻔뻔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또 그 카르텔은 어찌나 공고한지, ‘학문의 자유’나 ‘지성의 전당’ 같은 말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절감했다.
3·1운동의 평화적 시위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촛불광장’까지 이르는 민주주의적 의미를 지니는 혁명이었고 무엇보다 한국여성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한 사람 몫을 하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한국여성이 정치적 주체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며 여성 참정권을 획득하는 근거가 된다.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신분, 계급, 성을 떠난 평등을 임시헌장에 명문화하고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임시정부 계승을 천명한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수립과 함께 역시 성인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한다. 2022년 3월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개관을 했는데도 여성참정권이 ‘서프러제트’ 같은 무력투쟁을 수반한 서구와 달리, 해방 후 미군정을 거치며 거저 얻어졌다하는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아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여성공간의 상징 태화여자관 101주년’
비단 이뿐이 아니다. 여성의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잊히고 지워지기 일쑤다. 끊임없는 발견과 재해석, 의미부여 없이는 한 세대만 지나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사라져 버리곤 한다. 심지어 내가 살아온 반세기 안 되는 시간동안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목격했다. 2016년 강남역여성표적살인사건 전후로 등장한 온라인 페미니스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이 땅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무지를 탓해야할지, 기억되고 기려지지 못한 여성사를 안타까워 해야할지 아연했다. 남성들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멀리 나아갈 때, 여성들은 맨땅에서 또다시 시작해야하는 일이 허다한 이유다. 사소하게는 가문의 치장부터 국가 간 전통·영토 전쟁까지 역사는 단순히 지켜야할 것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사’는 사학계측에서도 여성학계측에서도 뚜렷한 대접을 받지 못하며 부유하는 모양새다.
다행히 여성계가 염원해 온 국립여성사박물관이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부지를 결정하고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여성사라는 분야가 국내에 확고히 자리 잡는 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만한 것은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에서 여성이 ‘종군위안부’ 같은 피해자적 위치가 두드러졌다면, 2010년대 들어 여성운동과 더불어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움직임이 크게 일었다는 점이다. 2019년에는 태화여학교 출신 여성 8명이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아 뒤늦게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았다. 김동희(1900~), 김상녀(1912~), 남윤희(1912~), 노보배(1910~), 민임순(1913~), 신준관(1913~), 정태이(1902~), 홍금자(1912~)가 그들이다. 1930년 1월15일 서울에서 태화여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는 만세운동과 동맹휴교에 참여하다 체포돼 구류형을 받은 것이 확인돼 모두 대통령표창을 추서 받았다.
민족성지 태화관에서 비롯된 ‘태화여자관’이 지난 세기 여성계에서 그 역할과 위상 면에서 상징하는 바가 컸을 텐데, 이런 중요한 기록들이 정사(正史)화 되지 못하고 낱낱이 흩어져가는구나 싶어 책을 쓰는 내내 속이 쓰렸다. 간신히 사료에 흔적이 남은 몇몇 인물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여성사의 명확한 한계다. 분단상황 등이 더해 아직 확보, 정리되지 못한 근현대사에서 증발된 여성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정립할 의무가 더욱 뚜렷해진다. 참고로 2021년 KBS에서 현충일 특집으로 ‘연순, 기숙’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해 눈길을 끌었는데, 10대소녀시절 여자의용군,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나섰던 여성들의 육성을 담은 것이다. 애국심, 의협심, 정의감 등은 남성 참전용사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자식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숨긴 것은 노벨상 수상작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여군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터이다. 훗날 영웅으로 추앙받기라도 할 심산으로 싸웠던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런 식으로 기억되지 못한 여성의 스토리(Herstory)가 얼마나 많을지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본서는 ‘태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당대 한국여성들이 여학생이라는 근대적 주체로 탈바꿈하며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개척해나갔고, 그 정신이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어머니와 아내로 주로 제한됐던 시대에도 그들의 ‘살림’과 ‘키움’이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역사를 만들어나가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을 지를 가늠해 보려한다. 태화관이 한국여성사에서 왜 핵심적 표상으로 기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가 이 책을 쓰는 단초가 됐다.
- [] 제6회 울진금강송 전국국악경연대회(06/08)
- [] 제29회 대통령상 한밭국악전국대회(07/06-07) (무용/기악/성악)
- [] 제8회 목담 최승희 전국국악경연대회(06/01) (판소리,기악)
- [] [서울]제28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06/15-16)
- [] 제32회 대전전국국악경연대회(06/01-02)
- [] 제16회 순천 낙안읍성 전국가야금병창경연대회(05/25-26)
- [] 제18회증평국악경연대회(05/11)
- [] [군산]제3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05/18)
- []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5/18∼6/2)
- []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5/18~6/3)
- [] 제20회 전국대금경연대회(06/08-09)
- [] 제4회 함양 전국국악경연대회(05/12)
- [] 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06/09)<br>무용(전통무용…
- [] 제48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06/15-16)(무용.기악)
- [] [부여]제1회충남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04)(판소리.기악.타악)
- [] [광주]제21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06/16)
- [] 제18회 과천전국경기소리경창대회(05/04)
- [] 제11회 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06/15-16)(판소리.무용, 기악,…
- [] 제24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05/25-26)
- [] 제26회 창원야철전국국악대전(07/06- 07)
- [] 2024 무안장애인 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22회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10회 전국공주아리랑민요경창대회(05/26)
- [] 제17회 상주전국국악경연대회(05/19)(성악/무용·연희/기악)
- [] 제10회 전국밀양아리랑경창대회(05/26)
- [] 제21회 강남전국국악경연대회(05/22)(무용/타악/판소리/민요)
- []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 고수 경연대회(05/04-05)
- [] [순천]제10회 낙안읍성 전국 국악대전(04/27-28)
- [] 제29회 안산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26)
- [] 제26회(통합58회) 여수진남전국국악경연대회(05/18-19)
- []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경연대회(05/05)(05/11-12)
- [] 제33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04/26-27)
- [] [부평]제8회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05/11)(관악/현악/성악)
- [] 제22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05/04-05)
- [완도]제24회 장보고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05/05-06)(무용/판소리…
- [] 제23회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05/25-26)
- [] [인천] 제10회 계양산국악제(04/26-27) (풍물,사물, 기악,민요…
-

[수요연재] 이무성 화백의 춤새(90)<br> 춤꾼 송영은의 '강선영류 태평무' 춤사…
태평무 국가무형유산 '태평무'는 강선영(1925-2016)선생에 의해 전해지면서 격조있는 무대예술로 발전 되었다. 태평무는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뜻을 지니...
-

[수요연재]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2)<br>강원도아리랑
강원도 아리랑을 쓰다. 한얼(2024, 선면에 먹, 53× 26cm) 봄바람 불어서 꽃 피건마는 고닯은 이 신세 봄 오나마나 ...
-

[화요연재]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81 <br> ‘국악의 날’ 지정을 위한 제언(8)…
최근 BTS를 배출한 하이브와 뉴진스를 배출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소식이 연일 연예 문화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 하이브의 주가가 약 1조원 가까...
-

[월요연재] 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4)<br>거문도 인어 '신지끼' 신격의 계보…
거문도의 인어 신지끼 "안개 있는 날에 백도와 무인도 서도마을 벼랑에서 주로 출몰 바위에 앉아 있거나 헤엄치기도 벼랑위에서 돌 던지기도 한다 해난사고나 바다에서 위험 경고...
-

[PICK인터뷰] 원장현 명인, “산조는 우리 삶의 소리”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오는 5월 9일과 10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이태백류 아쟁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바탕 '긴산조 협주곡'을 초연한다. 아쟁과 ...
-

[Pick리뷰] 경성 모던걸들의 춤판 '모던정동'…"자유 갈망하는 모습 담아"
30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린 국립정동극장예술단 정기공연 '모던정동' 프레스콜에서 출연진이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2024.4.30 ...
-

세실풍류, 박병천의 '구음시나위'에 허튼춤 선사한 안덕기
국립정동극장이 4월 한달간 진행하는 '세실풍류 : 법고창신, 근현대춤 100년의 여정'에서 23일 박병천의 '구음시나위'에 허튼춤 추는 안덕기 (사진=국립정...
-

세실풍류, 동해별신굿 민속춤사위를 제해석한 조재혁의 '현~'
국립정동극장이 4월 한달간 진행하는 '세실풍류 : 법고창신, 근현대춤 100년의 여정' 에서 조재혁의 '현~' 공연 모습. (사진=국립정동극장). 2024....
-

[Pick리뷰] 이호연의 경기소리 숨, ‘절창 정선아리랑!’
# ‘이호연의 경기소리 숨’ 공연이 지난 4월 26일 삼성동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렸다. 20대에서 60대까지의 제자들 20명과 5명의 반주자와 함께 경기잡가, 경기민요, 강원도...
-

[PICK인터뷰] 미리 만나 보는 '제94회 남원춘향대전'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손꼽히는 남원춘향대전(남원춘향제)이 오는 5월 10일(금)부터 5월 16일(목)까지 7일간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열...
-

[Pick리뷰] 모던연희극 ‘新칠우쟁론기’
4월 18일부터 20일, 남산국악당에서 아트플랫폼 동화의 모던연희극 ‘新칠우쟁론기’가 펼쳐졌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
-

[PICK인터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채치성 예술감독을 만나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봄비가 촉촉이 땅을 적시는 4월,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된 채치성 예술감독님을 만났다. 그는 국악방송 사장, KBS 국악관현...
-

[Pick리뷰] 이 시대의 새로운 춘향가- ‘틂:Lost&Found’
2024 쿼드초이스_틂 (사진=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나승열)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대학로극장 쿼드의 ‘쿼드초이스’...
-

[Pick리뷰] 세 악단의 조화로운 하모니, ‘하나 되어’
지난 4일, 국립국악원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KBS국악관현악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118명으로 구성된 연합 관현악단 무대 ‘하나되어’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