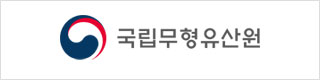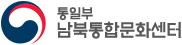2024.06.03 (월)
연재
흙의 소리
이 동 희
아악 <3>
「율려신서」는 이 나라 아악 창제에 초석이 되었다. 중국 고대부터 송대宋代까지의 악률樂律의 이론을 심도 있게 집약한 책으로 박연의 악리樂理의 기반이 되었고 그가 거침없이 논리를 펴고 상언上言을 하고 악기 제작 등을 하게 하였던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율려신서」는 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 ‘율려본원律呂本元’의 목차를 보면 서序 및 자서自序, 율려신서 천석목록淺釋目錄과 황종黃鍾, 황종지실黃鍾之實, 황종생십일율黃鍾生十一律, 십이율지실十二律之實, 변율變律, 율생오성도律生五聲圖, 변성變聲, 팔십사성도八十四聲圖, 육십조도六十調圖, 후기候氣, 심도深度, 가량假量, 근권형謹權衡 등 13항목과 ‘율려증변律呂證辨’은 조율調律, 율장단위경지수律長短圍徑之數, 황종지실, 삼분손익상하상생三分損益上下相生, 화성和聲, 오성소대지차五聲小大之差, 변궁변치變宮變徵, 육십조六十調, 후기, 도량권형度量權衡 등 10항목이 배열되어 있다.
미국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율려신서 천석淺釋’에서 인용한 목차에 보면 가량이 嘉量으로 되어 있다. 어떻든 글자의 뜻으로도 그 내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서는 스승인 주희가 썼다.
박연으로부터 이 책을 전해 받아 든 세종 임금은 손에 놓지 않고 독파하였다. 그리고 왜 악樂인가, 나라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였다. 왕은 예와 악, 예악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인류의 도덕 정치 질서의 틀로서의 예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악으로 교화함으로써 이상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것이다. 공자의 예악사상인 것이다. 악은 조화의 원리로써 통합을 추구하고 변이를 추구한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이다. 예와 악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의존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정情을 나타내고 정은 성聲으로 발하여 나오며 성은 율律과 조화를 이루어 음音이 되고 음은 덕을 갖추어 악樂이 된다. 음악의 원리를 다시 생각하였다.
예로써 질서를 잡고 악으로써 조화를 이루면 나라는 강하고 평화로워진다. 이상국理想國이 따로 없다. 악은 예를 표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왕권의 존엄과 권위의 상징이고…….

세종 임금은 철저한 예악사상가였고 그 실천가였다. 그것은 문학 박연이 충녕군에게 주입한 공맹사상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박연은 하나의 이론가였고 세종은 위정자로서 정책으로 밀어부쳤던 것이다. 막강한 힘이었다. 그것은 새 물결이 되었다. 박연은, 중국의 것이 좋은 것도 많지만 고쳐야 할 것도 많다고 상언하였으며, 그 잘 못 된 것을 과감하게 고치라고 왕명으로 밀어주었다. 450번이나 올린 박연의 상소를 다 받아들였던 것이다. 새로운 음악으로의 전환 개혁은 아악의 정립으로 이어졌고 밤낮으로 편경과 편종을 연구하여 편경 12개와 거기에 맞는 12율관을 새로 만들어서 정확한 아악을 연주할 수 있게 한 박연은 세종 임금에게 아악의 창제라는 희락을 바치게 된 것이다. 아악의 악보도 편찬해 내고 아악을 우리 음악으로 완성한 것이다.
세종 임금은 경연慶筵에서 「율려신서」를 강독하게도 하였다.
처음 고려 예종睿宗 때 송나라 휘종徽宗이 제악祭樂의 종鍾 경磬 등 악기를 내려 주었는데 제조가 매우 정밀하였다. 홍건적의 난리에 어느 늙은 악공이 종경 두 악기를 못 속에 던져 넣으므로 보존할 수 있었고(세종실록 59권) 명나라 태조 태종 황제가 종경을 다시 주었으나 제조가 매우 거칠고 소리도 아름답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제악祭樂은 팔음八音을 갖추지 못하여 봉상시에서 간직해 오던 십이관보十二管譜만 배울 뿐이고 제사 때가 되면 경은 와경瓦磬을 쓰고 종도 그 수효를 갖추지 못하였다. 거서秬黍(기장)가 해주에서 나고 경석磬石이 남양에서 생산되자 세종 임금은 박연에게 편경을 만들기를 명하였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본래의 음에 맞는 악기가 없었으므로 해주의 거서를 가지고 그 분촌分寸을 쌓아 고설古說에 의거하여 황종 한 관管을 만들어서 불어보았다. 그런데 그 소리가 중국의 종경과 황종 및 당악唐樂의 필률觱篥(피리) 합자성合字聲보다 약간 높았다. 그래 전현前賢의 논의를 다시 상고하여, 토지가 기름지고 메마름이 있어 기장의 크기가 크고 작음이 있으므로 성음의 높낮이가 시대마다 각각 다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양악서陳暘樂書」에 씌어 있었다.
박연은 무릎을 쳤다.
"대나무를 많이 잘라서 기운을 살펴서 바르게 함만 같지 못하다.”
북송北宋 진양陳暘의 의견이다.
그러나 박연은 다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역이 동쪽에 치우쳐 있어 중국 땅의 풍기風氣와는 전연 다르므로 기운을 살펴서 음률을 구하려 하여도 징험徵驗이 없을 것이다.
- [] <br>제24회 부평국악대축제 전국국악경연대회(07/13)
- 최고 명인명창 등용문 대명사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17일간 열전
- [] 제24회 공주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07/12-13)
- [] 제26회 서라벌전국학생민속무용경연대회(07/13-14)
- [] 제36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06/23) (판소리.무용.기악)
- [] 제4회 전국청소년공연예술제 대회(08/01)
- [] 제6회 시흥갯골국악대제전(06/22)
- []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 이소영씨
- [] 제8회 한국예술무형유산 전국경연대회(06/22)
- [] 제17회 대한민국 서봉판소리·민요대제전 (06/02)
- [] 제6회 울진금강송 전국국악경연대회(06/08)
- [] 제29회 대통령상 한밭국악전국대회(07/06-07) (무용/기악/성악)
- [] 제8회 목담 최승희 전국국악경연대회(06/01) (판소리,기악)
- [] <br> [서울]제28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06/15-16)
- [] 제14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추천해주세요.
- [] 제32회 대전전국국악경연대회(06/01-02)
- []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5/18∼6/2)
- []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5/18~6/3)
- [] 제20회 전국대금경연대회(06/08-09)
- [] <br>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06/09)무용(전통무용…
- [] 제48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06/15-16)(무용.기악)
- [] [광주]제21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06/16)
- [] 제11회 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06/15-16)(판소리.무용, 기악,…
- [] 제26회 창원야철전국국악대전(07/06- 07)
-

[김연갑의 애국가 연구] (35)애국창가 수록 ‘애국가’와 ‘한영서원가’의 가치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발행된 애국창가 2011년 8월 24일 문화재청은 ‘애국창가’를 등록유산 제475호로 지정했다. ...
-

[금요연재] 도자의 여로 (147)<br> 분청내섬시명발편
도편의 반 이상이 내섬명 이규진(편고재 주인) 내섬시(內贍寺)는 각 궁전에 대한 공상, 2품 이상에게 주는 술, 왜와 야인에게 주는 음식과 직조 등의 일을 맡아보던...
-

[국악단체장에게 듣다] 영남의 '강태홍류 산조춤' 전승하는 보존회장 김율희
김율희 (강태홍류 산조춤 보존회 회장) 김율희 이사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전통춤 4대 가업을 잇는 무용가다. 조부 김동민과 고모 ...
-

[수요연재]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5)<br>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을 쓰다. 한얼 이종선, (2024, 문양에 먹, 34× 34cm) 담뱃불로 벗을 삼고 등잔불로 님을 삼아 님아 님아...
-

"과거춤 복원해 다시 추는 기분"…김매자 '한국무용사' 재발간
현역 최고령 무용가인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스트극장에서 열린 '세계 무용사'출판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
-

[Pick리뷰] 토속민요의 힘, ‘일노래, 삶의 노래’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정기공연 '일노래, 삶의 노래' 공연 장면. (사진=국립국악원 ) 2024.05.22. 소박하고 향토적인 ...
-

[Pick리뷰] 日닛산서 9주년 세븐틴, 이틀간 14만명 환호<br>"후회없이 불태웠다"
세븐틴 일본 닛산 스타디움 콘서트 (사진=위버스 라이브 캡처) "오늘 저희가 (데뷔) 9주년인데,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전 세...
-

[Pick리뷰] 날씨도 영웅시대를 막을순 없다<br> 임영웅 "팬들과 큰꿈 펼칠게요"
임영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 (사진=물고기뮤직) 2024.05.26. "이깟 날씨쯤이야 우리를 막을 수 없죠....
-

[Pick리뷰] 여설뎐(女說傳)-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서울남산국악당에서 2024 남산소리극축제 ‘여설뎐(女說傳)- 싸우는 여자들의 소리’가 펼쳐졌다. 이 공연에서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극을 주도하는 ...
-

[PICK인터뷰] 김연자 "노래 좋아 달려온 50년…88 폐막식 하늘 지금도 생각나"
가수 김연자 (사진=초이크리에이티브랩) "오로지 노래가 좋아 달려온 50년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힘든 순간도 다...
-

[대기자 인터뷰] 공연예술로 하나가 되는 '더원아트코리아' 최재학 대표를 만나다
2년 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서울연희대전'이란 이름의 한 공연이 있었다. 제1회 '장구대전'이란 부제가 붙어있고, 입장권 전석이 판매 되어 화제가 되었다. 무대에서 오직 '장...
-

[PICK인터뷰] 두 줄이 내는 다채로운 숨, 해금 연주자 강은일 교수를 만나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나무 그늘이 우거진 5월의 한복판, 양재동의 한 공원에서 곧 있을 해금플러스 25주년 기념 공연 준비에 한창인 해금연주자 강은일 교수님을 만났다. 지저...
-

伊 기록유산 복원 전문가 "한지, 유네스코 등재될 가치 있어"
이탈리아 기록유산 복원 전문가인 마리아 레티치아 세바스티아니 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연구소(ICPAL) 소장이 최근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
-

[PICK인터뷰] 긴 호흡으로 들려준 산조의 정수, ‘긴산조 협주곡’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난 9일에서 10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 공연 ‘긴산조 협주곡’이 펼쳐졌다. 이태백류 아쟁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바탕이 협주곡으로 초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