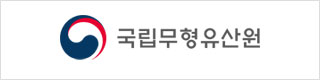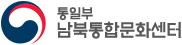2024.06.07 (금)
연재
이윤선(문화재청 전문위원)

서종원은 그의 글 "위도 띠뱃놀이에 등장하는 띠배의 역사성과 본연의 기능에 관한 고찰"(무형유산 제8호, 2020)에서 괄목할 만한 정보를 추적한 바 있다. 띠배를 띄워 보내는 것과 인당수의 인신공희를 역사적 자료를 통해 분석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는 항해자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 항해 도중에 특정 해역에 도착하면 신앙물(의례 도구)을 바다에 빠뜨리거나, 무사 항해를 위해 암초 등에 불상을 올려놓고 간략하게 경을 읽었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다. 유독 물살이 센 곳이나 해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점에 도착하면 항해자들은 특별한 의례를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화랑세기(花郞世記)』와 서긍(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그때 풍랑을 만났는데 뱃사람이 여자를 바다에 빠뜨리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공이 막으며 "인명은 지극히 중한 데 어찌 함부로 죽이겠는가?"하였다. 그때 양도 또한 선화로서 같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다투어 말하기를 "형은 여자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공을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만약 위험하면 장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하였다. 공이 침착하게 말하기를 "위험하면 함께 위험하고 안전하면 함께 안전하여야 한다. 어찌 사람을 죽여 삶을 꾀하겠는가?"하였다. 말을 마치자 바람이 고요하여졌다. 사람들은 해신이 공의 말을 듣고 노여움을 풀었다고 생각하였다>. <신시 후에 합굴에 당도하여 정박하였다. 그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고 주민도 역시 많았다. 산등성이에 용사(龍祠)가 있는데 뱃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데 바닷물이 이곳에 이른다>

순조로운 항해를 희구하는 뜻으로 어전(御前)에서 내린 풍사용왕첩(風師龍王捷)과 지풍위(止風位) 등이 적힌 부적 13부(符)를 바다에 던졌다는 내용도 곁들여진다. 여기서의 위(位)를 위패나 나무 조각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기록과 설화들을 견주어 살펴보면 인당수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을 엿볼 수 있다. 내가 주목했던 것은 거타지와 작제건 설화를 비롯한 심청전의 인당수 이야기가 포획하고 있는 동아지중해로서의 물길과 거센 파도, 그 안에 담은 희망과 소망의 투사다. 고대로부터의 연안항로와 사단항로 중 유독 물길이 험한 곳들이 있었고 이 장소를 매개 삼은 사고체계나 대응방안들이 실제 의례는 물론 문화적으로 재해석되어 각종 모티프로 기능해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 [] <br>제24회 부평국악대축제 전국국악경연대회(07/13)
- 최고 명인명창 등용문 대명사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17일간 열전
- [] 제24회 공주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07/12-13)
- [] 제26회 서라벌전국학생민속무용경연대회(07/13-14)
- [] 제36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06/23) (판소리.무용.기악)
- [] 제4회 전국청소년공연예술제 대회(08/01)
- [] 제6회 시흥갯골국악대제전(06/22)
- []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 이소영씨
- [] 제8회 한국예술무형유산 전국경연대회(06/22)
- [] 제6회 울진금강송 전국국악경연대회(06/08)
- [] 제29회 대통령상 한밭국악전국대회(07/06-07) (무용/기악/성악)
- [] <br> [서울]제28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06/15-16)
- [] 제14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추천해주세요.
- []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5/18~6/3)
- [] 제20회 전국대금경연대회(06/08-09)
- [] <br>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06/09)무용(전통무용…
- [] 제48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06/15-16)(무용.기악)
- [] [광주]제21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06/16)
- [] 제11회 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06/15-16)(판소리.무용, 기악,…
- [] 제26회 창원야철전국국악대전(07/06- 07)
-

[수요연재]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6)<br> 밀양아리랑
(2024, 선지에 먹, 55× 35cm) 밀양아리랑을 쓰다. 한얼 이종선 窓外三更 細雨時(창외삼경 세우시) 잊으리라 잊으리라...
-

[화요연재]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83)<br>‘국악의 날’ 지정 – 악학궤범이 편…
그동안 ‘국악의 날 지정을 위한 제언’을 약 5개월에 걸쳐서 연재하였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악학궤범을 편찬한 날로 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몇 명의 국악인들이 국...
-

[김연갑의 애국가 연구] (35)애국창가 수록 ‘애국가’와 ‘한영서원가’의 가치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발행된 애국창가 2011년 8월 24일 문화재청은 ‘애국창가’를 등록유산 제475호로 지정했다. ...
-

[금요연재] 도자의 여로 (147)<br> 분청내섬시명발편
도편의 반 이상이 내섬명 이규진(편고재 주인) 내섬시(內贍寺)는 각 궁전에 대한 공상, 2품 이상에게 주는 술, 왜와 야인에게 주는 음식과 직조 등의 일을 맡아보던...
-

[대기자 인터뷰] 퇴임하는 김영운 국립국악원장
[국악신문 안상윤 대기자]=6월5일 오전 국립국악원 우면당 앞마당.예고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경연대회에 앞서 목을 풀고 있고,예악당에서는 국악 종사자들에게 이론 지식과 실무 경험을 ...
-

"과거춤 복원해 다시 추는 기분"…김매자 '한국무용사' 재발간
현역 최고령 무용가인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스트극장에서 열린 '세계 무용사'출판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
-

[Pick리뷰] 토속민요의 힘, ‘일노래, 삶의 노래’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정기공연 '일노래, 삶의 노래' 공연 장면. (사진=국립국악원 ) 2024.05.22. 소박하고 향토적인 ...
-

[Pick리뷰] 日닛산서 9주년 세븐틴, 이틀간 14만명 환호<br>"후회없이 불태웠다"
세븐틴 일본 닛산 스타디움 콘서트 (사진=위버스 라이브 캡처) "오늘 저희가 (데뷔) 9주년인데,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전 세...
-

[Pick리뷰] 날씨도 영웅시대를 막을순 없다<br> 임영웅 "팬들과 큰꿈 펼칠게요"
임영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 (사진=물고기뮤직) 2024.05.26. "이깟 날씨쯤이야 우리를 막을 수 없죠....
-

[Pick리뷰] 여설뎐(女說傳)-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서울남산국악당에서 2024 남산소리극축제 ‘여설뎐(女說傳)- 싸우는 여자들의 소리’가 펼쳐졌다. 이 공연에서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극을 주도하는 ...
-

[PICK인터뷰] 김연자 "노래 좋아 달려온 50년…88 폐막식 하늘 지금도 생각나"
가수 김연자 (사진=초이크리에이티브랩) "오로지 노래가 좋아 달려온 50년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힘든 순간도 다...
-

[대기자 인터뷰] 공연예술로 하나가 되는 '더원아트코리아' 최재학 대표를 만나다
2년 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서울연희대전'이란 이름의 한 공연이 있었다. 제1회 '장구대전'이란 부제가 붙어있고, 입장권 전석이 판매 되어 화제가 되었다. 무대에서 오직 '장...
-

[PICK인터뷰] 두 줄이 내는 다채로운 숨, 해금 연주자 강은일 교수를 만나다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나무 그늘이 우거진 5월의 한복판, 양재동의 한 공원에서 곧 있을 해금플러스 25주년 기념 공연 준비에 한창인 해금연주자 강은일 교수님을 만났다. 지저...
-

伊 기록유산 복원 전문가 "한지, 유네스코 등재될 가치 있어"
이탈리아 기록유산 복원 전문가인 마리아 레티치아 세바스티아니 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연구소(ICPAL) 소장이 최근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