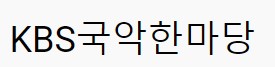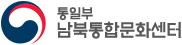2024.04.19 (금)
연재
박대헌 고서점 호산방 주인, 완주 책박물관장
옛날에 준마를 팔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흘 내내 그 말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준마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이에 말 주인은 백락(伯樂)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내게 준마가 있어 팔려고 하는데, 사흘 동안이나 시장에 내놓았는데도 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선생께서 제 말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떠나시다가 아까운 듯한 표정으로 한번 뒤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 하루 벌이를 그 대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에 백락이 말을 살펴본 후 그 자리를 떠나다가 한번 뒤돌아보았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말의 가격이 열 배로 올랐다.
『전국책(戰國策)』에 나오는 이야기다. 춘추시대 진(秦)나라 사람 손양(孫陽)은 말 감정에 조예가 깊은 명인으로, 그의 탁월한 안목과 식견에 탄복한 사람들은 천마(天馬)를 주관한다는 별의 이름을 따 그를 본명 대신 ‘백락’이라 불렀다. 어찌나 정평이 높던지 그의 품평 한마디에 말 값이 순식간에 몇 곱절씩 뛰어오를 정도였다. 고서 수집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고서에 뛰어난 안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책에 관심을 보이면 그 책은 비싼 가격으로 팔리기도 한다.
언젠가 청계천에서 있었던 일이다. 평소 친분 있는 지인으로부터, 지금 막 모 서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책을 보았으니 서둘러 가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곧장 달려가니 주인이 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책값은 방금 전화로 전해들은 값의 두 배를 불렀다. 아무 말 않고 돈을 건넨 뒤 책을 들고 나왔다.
불과 한 시간도 안 되어 책값을 두 배로 올렸는데, 이처럼 고서점 주인이 손님에 따라 가격을 달리 부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손님이 책의 내용을 잘 알아보는 듯하거나 꼭 필요해서 살듯 한 경우에는 이런 수법을 쓰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것을 따지고 들면 서로 관계만 어색해지니 그냥 모른 척한다.
![[사진 36] 티베트 불경2.JPG](http://kukak21.com/data/editor/2012/20201229210214_575322d521bf3bfab5af526fa7132823_68cw.jpg)
그날 구입한 책은 『홍전시략(紅田詩略)』 필사본이었다. ‘홍전시략’은 표제이고 속표제는 ‘자하시집(紫霞詩集)’이라고 씌어 있었다. 자하는 조선 후기 문신이자 화가·서예가로 유명한 신위(申緯)의 호다. 책 윗부분이 조금 손상됐지만 됨됨이가 반듯한 것이 첫눈에 귀물이었다. 시종일관 단아한 글씨로 아주 정성스레 만든 필사본이었다. 대부분의 필사본이 그렇지만 문제는 누구의 친필인가 하는 것이다. 잘 만들어진 필사본 중에는 해서(楷書)로 쓴 글이 많은데, 이 경우 누구의 글씨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의 글씨가 그랬다. 일점일획을 정확히 독립시켜 쓴 것으로, 파세(波勢)가 없고 방정하게 정서(正書)했다. 또 목판 괘선지의 판심(版心) 아래 어미(魚尾) 상부에 안경 모양의 그림이 새겨져 있어 이채로웠다.
순간 나는 자하의 친필임을 직감했다. 그러니 책값을 두 배로 불러도 안 살 도리가 없었다. 그날 N씨가 호산방에 들렀다가 이 책을 보더니 갖고 싶다고 했다. 당시 그는 청량리 근처에서 꽤 규모있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한 탓에 책을 사 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늦게나마 책을 사 본다고 했다. 그는 고서에는 문외한이었지만 내 말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랐다.
그리하여 결국 이 책은 그의 손으로 넘어갔다. 일 주일쯤 후, 나는 우연히 어떤 책을 보다가 연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몽홍선관시초(夢紅仙館詩抄)』를 발견했다. 이 책은 자하의 친필로 알려진 책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괘선지의 판심에 『홍전시략』의 안경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N씨에게 보낸 『홍전시략』 괘선지의 문양과 연세대 소장본 『몽홍선관시초』의 그것은 분명 일치했다. 이 괘선지는 바로 자하의 전용지였던 것이다.
또 한번은 한 서점에서 이삼십 권의 책을 골라 놓고 각 권에 대한 가격을 셈하는데, 주인에게 가격을 물었더니 처음에 말했던 것과 달랐다. 조금 전에 부른 가격을 주인도 헷갈려 하는 것이다. 고서를 수집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고서에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서점 주인의 재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터무니없이 비싸게 불렀다 하더라도 손님과 주인의 관계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고서점의 생리다.
가령 손님이 "이것은 그렇게 비싼 책이 아니고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소” 하면 주인은 못 이기는 체하고 적당한 선에서 고객의 요구에 응한다. 이러한 예가 고서점에서 관례가 된 풍경이다. 어찌 보면 이렇듯 같은 책이라도 고서점마다 가격이 다 다른 것이 고서 수집의 매력인지도 모른다. 고서점 주인은 고서를 입수한 후 가격을 정하기까지 나름대로의 고민과 연구를 거듭한다. 가격을 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 중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손님에게 책을 보여 주면서 눈치를 살피는 경우도 있다.
"이거 소장자가 팔아 달라고 맡긴 건데, 얼마에 사면 되겠소?” 그러면 자연스레 얼마에 팔면 되겠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만약 그 과정에서 손님이 그 책을 욕심내면 주인 입장에서는 머쓱할 수밖에 없다. 손님이 되레 주인에게 "그래, 소장자가 꼭 얼마를 받겠답디까?” 물으면, 주인이 "이거 소장자가 얼마를 받아 달라는데” 하면서 아주 높은 가격을 던져 보기도 한다. 이처럼, 서점 주인들은 낯선 책의 가격을 알아보는 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령을 가지고 있다. 설령 자신이 제시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도 민망해 할 까닭이 없다. 이미 ‘소장자가 맡긴 물건’이라고 복선을 깔았기 때문이다.
![[사진 37] 원교서결.JPG](http://kukak21.com/data/editor/2012/20201229210014_575322d521bf3bfab5af526fa7132823_ni7z.jpg)
또 심상치 않은 고서를 입수하면 일단 가게 한구석에 무심한 척 놔두고는 손님이 물어 올 때를 기다린다.
"이거 얼마요?”
"그건 팔 물건이 아닌데….”
"…….”
"굳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나 주겠소?”
이때 손님은 책이 욕심나면 나름대로 가격을 제시하는데, 그러면 십중팔구 그 책을 사지 못한다. 주인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높으면 혹시 이것이 아주 귀한 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쉽게 팔지 않을 것이고, 생각했던 가격보다 낮으면 적당히 거절한 뒤 다른 손님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쓴다.
나는 이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가격을 잘 몰라서 나보고 얼마면 사겠냐고 물었을 텐데, 그럼 내가 제시하는 값에 무조건 팔 겁니까? 그렇다면 성의껏 말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꼭 받고 싶은 값을 먼저 말하십시오. 값이 적당하면 사겠습니다.”
나는 절친한 사이가 아니면 절대로 가격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 저렇게 묻는 것은 얼마가 되더라도 애당초 나에게 물건을 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잔꾀를 부린 것일 뿐이다.
- [] 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대제전(06/09)<br>무용(전통무용…
- [] 제48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06/15-16)(무용.기악)
- [] 제1회충남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04)(판소리.기악.타악)
- [] <br>[광주]제21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06/16)
- [] 제18회 과천전국경기소리경창대회(05/04)
- 제11회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06/15-16)
- [] 제24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05/25-26)
- [] 제26회 창원야철전국국악대전(07/06- 07)
- [] 2024 무안장애인 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22회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06/01-02)
- [] 제10회 전국공주아리랑민요경창대회(05/26)
- [] 제17회 상주전국국악경연대회(05/19)(성악/무용·연희/기악)
- [] 제10회 전국밀양아리랑경창대회(05/26)
- [] 제21회 강남전국국악경연대회(05/22)(무용/타악/판소리/민요)
- []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 고수 경연대회(05/04-05)
- [] [순천]제10회 낙안읍성 전국 국악대전(04/27-28)
- [] 제29회 안산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5/26)
- [] 제26회(통합58회) 여수진남전국국악경연대회(05/18-19)
- []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경연대회(05/05)(05/11-12)
- [] 제33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04/26-27)
- [] [부평]제8회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05/11)(관악/현악/성악)
- [] 제22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05/04-05)
- [완도]제24회 장보고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05/05-06)(무용/판소리…
- [] 제4회 금천정조대왕맞이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04/13-14)
- [] [세종시]제10회 통일기원 세종전국국악경연대회(04/06-07)
- [] [전주]제44회 전국고수대회(04/20-21)
- [] 제23회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05/25-26)
- [] [인천] 제10회 계양산국악제(04/26-27) (풍물,사물, 기악,민요…
- [] [양산] 제46회전국무용예술제(03/31)
-

[수요연재]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88)<br>원주어리랑, 산은 멀고 골은…
원주어리랑을 쓰다. 한얼이종선 (2024, 문양지에 먹, 34 × 34cm)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요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

[수요연재] 이무성 화백의 춤새(87)<br> 정인삼 명인의 '신칼대신무' 춤사위
신칼대신무 신칼대신무는 무속장단과 巫具를 활용한 재인의 춤으로, 장단과 움직임의 법도 있는 만남을 잘 보여주는 춤이다. 구한말 화성재인청에서 가르친 50여 가지의...
-

[화요연재] 무세중과 전위예술(9) <BR>김세중의 한국민속가면무극 춤사위 발표회19…
멍석 위에서 민속극에 뜻을 둔 이래 가장 절실했던 것은 둔한 몸을 가지고 직접 춤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 생활의 분신의 하나인 전통 민속극과 좀처럼 사귀어...
-

[월요연재] 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0)<br>잔인한 적군의 시신까지 거든 바다의…
왜덕산(倭德山)의 비밀 피아를 나누지 않고 위령 바다사람들 심성 깃들어 왜군에도 그러해야 했던 섬과 바다의 민속 관념은 인류의 박애 정신 아닐까 교착상태 빠진 한·일 문...
-

[수요연재]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88)
갑진년 사월에 강원도 아리랑을 쓰다 오거서루주인 이종선 (2024, 한지에 먹,48 × 56cm) ...
-

[금요연재] 도자의 여로(140)<br>분청조화문대발편
'무도회의 추억' 속 여주인공처럼 이규진(편고재 주인) 선운사 골째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백이 가락...
-

[Pick리뷰] 세 악단의 조화로운 하모니, ‘하나 되어’
지난 4일, 국립국악원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KBS국악관현악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118명으로 구성된 연합 관현악단 무대 ‘하나되어’를 국...
-

[인터뷰] 김경혜의 '시간의 얼굴' 작품전, 16일 개막
칠순을 넘어서는 길목에서 중견작가 김경혜(영남이공대 명예교수) 작가의 열번째 작품전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대구시 중구 슈바빙 갤러리에서 열린다.전시되는총 50여 개...
-

[Pick리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시리즈 III ‘한국의 숨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시리즈 III ‘한국의 숨결’이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박상후의 지휘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졌다. (사진=국립국악관현악단...
-

[PICK인터뷰] 국악인생 60여년, 한상일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한상일(1955~)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는 국악에 입문한 지 올해로 60여 년을 맞는다. 때 맞춰 지난 1월 25일 서울문화투데이 신문에서 선정하는 제15회 문화대...
-

[Pick리뷰] 명연주자 시리즈 ‘국악관현악-공존(共存)’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난 3월 22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서울시국악관현악단 2024 명연주자 시리즈 ‘공존(共存)’ 무대가 펼쳐졌다. ‘명연주자 시리...
-

[Pick리뷰] 소리극 ‘두아-유월의 눈’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지난 12일부터 22일, 국립정동극장은 대표 기획공연 사업 ’창작ing’의 두 번째 작품, 소리극 ‘두아:유월의 눈’을 무대에 올렸다. ‘두아:...
-

한류의 의외의 원류? ‘일본아리랑’에 놀라
한국을 대표하는 음곡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노래다. 각종 스포츠 대회나 정상회담 만찬회 등 공식 행사에서는 어김없이 연주되...
-

[인터뷰] 이즘한글서예가전 신인작가 이광호 작가의 시선
봄바람을 타고 13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네번째이즘한글서예가전에서 출품한 30명의 작가 중 가장 젊은 신인작가라고 한얼 회장이 소개를 한 3분의 작가 중 이광호(43세)...
-

[Pick리뷰] 전통 탄탄한 국악관현악: ‘작곡가 이강덕
[국악신문 정수현 전문기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지난 7~8일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Ⅲ’을 선보였다.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의 토대가 된 작곡가를 선정해 의미를 되...
-

[Pick리뷰] 찰나의 순간 자유로움, ‘즉흥음악축제’
[국악신문 정수현 국악전문기자]=지난 2월, 서울돈화문국악당과 남산국악당은 전통음악,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음악적 협업을 통해 자유로운 즉흥음악을 선보...